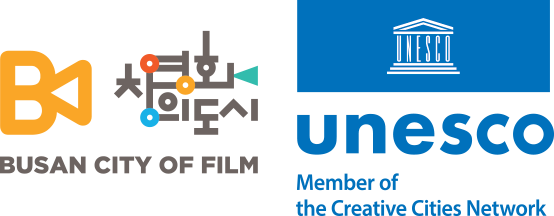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내가 누워있을 때>: 무례한 세상에서 투닥투닥, 토닥토닥2023-12-19
-

<내가 누워있을 때>: 무례한 세상에서 투닥투닥, 토닥토닥
김현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최정문 감독의 첫 장편영화 <내가 누워있을 때>는 몇 줄로 요약 가능한 이야기의 영화가 아니다. 왜냐면 감독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이다. 각자 사연이 있는 세 여자가 할머니의 기일을 맞아 산소를 찾아가다 일이 점점 꼬이게 된다. 운전 중 사고가 나 차의 앞 범퍼가 찌그러진다. 범퍼의 수리를 맡은 카센터 업체의 사장은 태도가 뭔가 무례하고 공격적이다. 사장은 그녀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눈치를 챈 세 여자들은 돈을 지급하길 망설이고 이에 화가 난 사장은 한 밤중에 세 여자들이 묵고 있는 모텔로 쳐들어간다. 이렇게 쓰고 나니 이 영화가 마치 포크 호러, 즉 시골을 배경으로 한 호러나 스릴러 장르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실제로 감독도 그런 긴장감을 주는 요소들을 영화 사이사이에 넣고 있다. 하지만 <내가 누워있을 때>는 단순한 스릴러물로 분류되길 거부하는 영화다. 세 여자의 예기치 않은 여정만큼이나 세 여자 각자가 가진 사연 하나하나가 중요한 비중으로 영화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 여자의 세 가지 사연들은 그저 회상, 인물들을 설명하는 플래시백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영화 속 영화, 다시 말해서 장편영화 속 단편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내가 누워있을 때>는 하나의 단일한 장편영화라 하기 보다는 실은 연작소설집처럼, 한 편의 중편영화 속에 세 편의 단편영화를 같이 품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할 것이다.

세 여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다. 세 여자 중 맏언니인 선아(정지인 배우)는 서울의 광고회사에서 일한다. 남자 상사와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하게 된 선아는 이를 승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다른 팀이 따온 프로젝트를 자신이 맡게 해달라고 상사에게 부탁하고, 곧 그 일을 맡게 된다. 하지만 그 뒤로 사내 연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꽃뱀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된다. 선아는 이직을 고민한다. 선아의 이종사촌동생 지수(오우리 배우)는 고등학생 시절에 수진이란 여학생과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학교에 레즈비언 커플이란 소문이 다 퍼지고, 지수는 겁이 난다. 지수의 친구 보미(박보람 배우)는 비보잉을 하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임신의 사실을 알지 못한 남자친구의 몹쓸 장난으로 인해 사산을 하게 된다. 보미는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이후로 보미는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기 시작한다.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 선아, 지수, 보미 각자의 과거 이야기와 세 사람이 마주한 현재의 이야기는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공통점을 찾자면 사고로 인한 경로 이탈이다. 그들은 비유적인 의미로든 실제로든 사고를 당했으며 자신이 가야하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태다. 또 하나 더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무례함이다. 선아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지수는 학교 친구들에게, 보미는 남자친구에게 무례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여정에서는 카센터 사장의 무례함을 또 마주친다. 범위를 더 넓혀보면 카센터에서 일하는 병재(이한주 배우) 역시도 무례함에 시달리고 있다. 삼촌이자 사장인 그의 행동이 범죄란 걸 알면서도 병재는 폭압적인 삼촌에게 대들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누워있을 때>는 무례함에 짓눌리며 거기에 맞서야 하는 이야기다. 과거의 무례함, 그리고 현재에 또 다 같이 겪어야 하는 무례함. 이게 최정문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무례한가?
각자도생이란 말이 공기처럼 떠돌면서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또 누군가도 각자의 이유로 다 힘든데 그걸 서로가 해결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기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나의 고통은 너의 고통과 전혀 무관하고 딱히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서로 털어놓자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자고, 이 영화 <내가 누워있을 때>가 우리에게 제안한다. 숨구멍을 뚫지 않으면 마음도 질식 상태에 놓일 수 있으니까.
아쉽게도 이 영화의 리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지만 더 쓰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면 분량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해야겠다. <내가 누워있을 때>를 보고나서 최정문 감독의 단편영화들, 그리고 언젠가는 만들어질 두 번째 장편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여성감독의 여성 서사가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 다음글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위무와 사랑
- 이전글 <만분의 일초>: 자승자박, 결자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