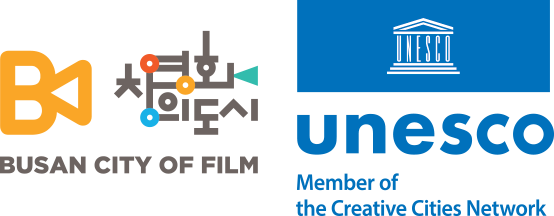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론글은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글을 통해 들여다본 새로운 영화세상으로 떠나보세요!
- 월드시네마 2020 - 세계영화사 오디세이 <나는 흑인>2020-05-18
-

<나는 흑인>
장지욱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장 루슈의 <나는 흑인>(1958)을 총칭하기 위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혼재라고 답할 것이다. 영화는 혼재된 요소들로 가득하며 이들이 만든 각자의 층위들은 또 다시 충돌한다. <나는 흑인>을 감상하는 관객은 나아가고 섞이고 충돌하고 다시 무언가로 퍼져 나가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일종의 놀이처럼 쫓아가게 된다. 영화 속 인물들은 비연기자인가, 배우인가?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인가, 픽션인가? 관객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끝에서 왜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쫓는 놀이를 또다시 이어 갈 것이다.
장 루슈는 영화 전반에 내재한 혼재성을 영화 초반부터 암시해 두었다. <나는 흑인>의 오프닝은 관성적으로 음악이 깔리는 지점에서 영화 속 누군가의 육성 노래가 음악의 자리를 대신한다. 내레이션으로 도시의 배경을 설명해 나아가다 서부 영화 포스터가 걸린 극장을 보여 주는데, 이때, 영화 속 장면인 듯한 총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카메라가 팬을 하면, 교통사고가 난 도로 위의 현장이다. 총소리로 들리는 ‘사건의 암시’와 교통사고라는 실재 현장은 불일치하지만 사건을 알리는 ‘신호음’으로써 한 장면 안에 두 가지 상황이 핍진하게 작동한다.
혼재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영화 전반에 자리한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뒤섞임에서 야기되는 불분명한 정체성을 만날 수 있다. 영화는 아프리카 트레시빌의 항구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삶을 조명한다. 장 루슈는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흑인 청년을 내레이터로 내세우는데 그의 발화로 전개되는 영화의 양상은 하루하루 노동과 일상을 담으면서 다큐멘터리 방식을 취하는 듯 나아가다가 그의 욕망을 그려 내는 상상 장면에서 픽션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경계를 넘나든다.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흑인 청년은 애초에 혼재된 존재이다. 이 흑인 청년은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할리우드의 백인 유명 배우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이 같은 설정은 감독이 의도한 형식적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서도 유효하지만 동시에 항구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오늘과 이들이 그리는 자본적 욕망이 뒤섞인 트레시빌의 현재가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이름과 조응하게끔 한다.
관객은 다른 층위에서의 혼재 또한 추적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인 장 루슈의 카메라로부터 출발해 본다면 말이다. 영화감독이면서 동시에 인류학자였던 장 루슈가 <나는 흑인>에서 흑인을 내레이터로 내세우고 기존의 다큐멘터리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 시도는 비단 형식적인 시도에 그치지 않는다. 1950년대 말 아프리카는 2차 대전 이후로 지속되어 오던 식민주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주장해 왔다. 이전부터 인류학자로서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풍속을 영화에 담아 왔던 장 루슈는 식민지-피식민지 관계가 종식되는 전환기에서 서구 중심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다.
이렇듯 저마다 갈래를 쫓다가 종착에 도달하기 전에 이 영화의 제목을 다시금 곱씹어 봐도 좋을 듯하다. ‘나’와 ‘흑인’사이의 쉼표를 통해 관객은 ‘나’를 규정해 볼 것이며, 그에 따라 객체인 ‘흑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 원제에서 ‘누아르’라는 단어에 매혹되어 영화 속 권투 장면이나 상상 장면을 복기해 볼 수도 있고, 시대를 바라보는 장 루슈의 시선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경계를 뒤섞고자 한 동기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장 루슈는 카메라는 피사체의 뒤에 숨어서 자리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허물고자 시도했고 카메라와 감독의 위치는 이전의 그것과 달라졌다. 그의 고민과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나는 흑인> 이후 에드가 모랭과 <어떤 여름의 연대기>(1961)를 발표하면서 ‘시네마 베리테(진실 영화)’를 주창했다. 참여적인 카메라로서의 영화를 통해 진실(베리테)을 추구한다는 그의 시도는 삶의 모습을 영화가 어떻게 담아내는가에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 다음글 월드시네마 2020 - 세계영화사 오디세이 <대리석 인간>
- 이전글 월드시네마 2020 - 세계영화사 오디세이 <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