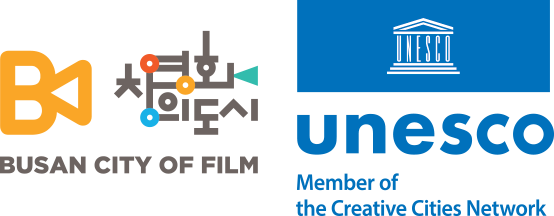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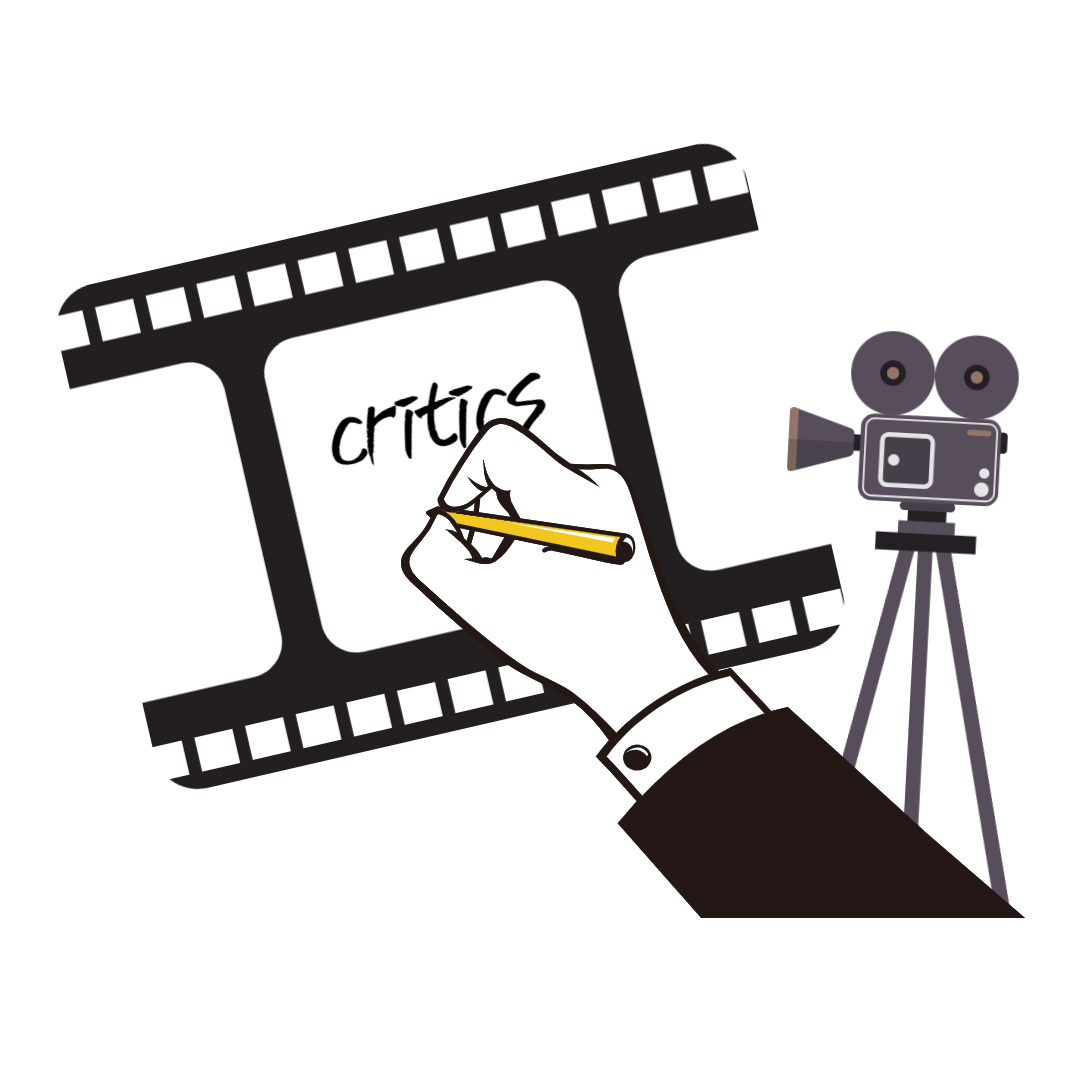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죽음 곁의 삶에 대한 생철학적 사유, <숨>(2025)2025-03-28
-

죽음 곁의 삶에 대한 생철학적 사유, <숨>(2025)
윤필립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에서 죽음을 소재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다큐멘터리 작품은 개봉 당시 4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진모영 감독, 2014, 이하 ‘님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상실감에 초점을 두며, 그것은 노부부의 사랑을 더욱 애틋하게 만듦으로써 고귀한 사랑과 그 숭고함을 포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님아...>류의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와 같은 내러티브를 영화적 동력으로 삼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보는 재미’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극영화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사실적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미덕이 묻혀버리는 단점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영화 <숨>(윤재호 감독, 2025)은 다큐멘터리로서의 제 임무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 물론, 지금의 세대는 내러티브를 중요시하는 데 반해 <숨>에는 그것이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이 작품이 관객들과 만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윤재호 감독은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이 작품 안에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일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동일시의 측면에서 영화는 죽음을 장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일례로, 공포영화에서 죽음은 관객들에게 피해자로서의 공포감을 형성하고, 액션영화에서는 처단자로서의 쾌감을 주며, 멜로드라마에서는 눈물이라는 감정적 정화 작용을 일으킨다. 그런데 관객들이 이러한 장르영화 속에서 죽음을 대할 때에는 그것이 스크린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구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일인 것으로 인지되고, 그에 따라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죽음과 거리를 두기 쉽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 속 죽음을 향한 관객들의 대처법이 다큐멘터리 장르로 넘어오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장르영화 속의 죽음이 관객들에게는 그저 남일이었다면, 다큐멘터리 속의 죽음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나의 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객들은 영화의 장르에 따라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크게 다른데, 쉽게 말하면 장르영화 속 죽음에 대한 반응은 ‘타자화’로, 다큐멘터리 속 죽음에 대한 반응은 ‘동일시’로 비유할 수 있겠다.

여기서 영화 <숨>은 후자에 속한다. 이 작품에서 죽음은 당연히 늘 우리의 곁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주제의식이 구태의연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말을 붙여본 적은 없는, 그런 범상치 않은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로는 장례지도사, 몸 성한 곳 없이 폐지 줍는 노인, 유품정리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례지도사는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폐지 줍는 노인은 생의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유품정리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비워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죽음의 곁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이면서도 좀 더 철학적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과적으로 관객들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동일시되는 효과를 거둔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화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이기에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사한다.

결론적으로, <숨>은 <님아...>와 같은 드라마틱한 서사적 장치로 ‘눈물’을 직조하는 대신 사실적 기록 장치(등장인물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관객들 스스로가 죽음의 곁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생철학적 ‘사유’를 자극하는 데 성공한다.
- 다음글 피프레시 2024년 12월 월요시네마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관하여
- 이전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