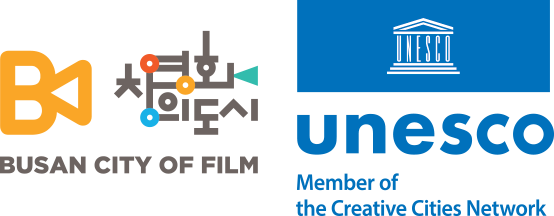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 신의 언어와 빈약한 오역들2025-02-26
-

신의 언어와 빈약한 오역들
이시현 2023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 수상자
<브루탈리스트>는 유대계 헝가리인 건축가 ‘라즐로 토스’가 나치의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의 일대기를 다룬다. 3시간 반의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이 영화는 혼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암시를 잦게 제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러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소 거칠게, 가능한 해석을 크게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나는 혼탁함 속에서 모종의 본질을 움켜쥐려는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고, 우리는 이 영화 앞에서 그저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겠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이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과 시오니즘이라는 두 건국 신화를 비판하는 영화로 해석될 수 있다. 서막에서 ‘라즐로’의 조카, ‘조피아’는 병사들 앞에서 침묵을 유지한다. 목소리를 잃은 약소국의 설움을 상징하는 이 장면 이후 ‘라즐로’는 이민선의 갑판 위에서 뒤집힌 자유의 여신상을 목도한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뒤집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영화는 시종일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 ‘라즐로’의 사촌 ‘아틸라’는 미국인도 아니며 자식도 없지만 ‘밀러와 부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가구 가게를 운영한다. ‘라즐로’에게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할 기회를 주는 백만장자 역시 사생아로서의 상처를 숨기지 못하며, 그의 성씨 역시 네덜란드식인 ‘밴 뷰런’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미국적인 것 따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폭로한다.

미국에서의 어느날, ‘조피아’는 ‘라즐로’에게 자신은 유태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로 떠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유태인이라면 이스라엘에서 해방을 구해야 마땅하다며, 미국에 남길 선택한 ‘라즐로’와 그의 아내 ‘에르제벳’에게 무례한 발언조차 꺼리지 않는다. ‘라즐로’가 ‘밴 뷰런’에게 강간당하는 등 수모를 당할 때 ‘조피아’는 ‘라즐로’의 곁을 지키지 않았으나, 에필로그에서 그녀는 ‘라즐로’의 건축물은 그가 수감되었던 강제수용소와 이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라즐로’를 시오니즘의 상징으로 전시한다. 이에 대해 침묵하는 ‘라즐로’의 얼굴로 영화는 끝맺음하는 만큼 <브루탈리스트>는 아메리칸 드림이 허구적인 것만큼이나 시오니즘이 허구적임을, 그리고 개인은 이 신화 앞에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 해석은 영화의 수미상관 구조 등등을 고려했을 때 대내적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건국 신화의 허구성이라는 거시적 주제만으로는 적절히 포섭되지 않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라즐로’ 개인의 소수자성에 주목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들이다. 유대계 헝가리인으로서 겪는 차별, 장애인 아내와의 관계, 흑인 노동자와의 연대 등등이 대표적 예시이며, 우리는 과감한 해석을 감수함으로써 ‘라즐로’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추가적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라즐로’가 결혼을 했음에도 자식이 없다는 점, 그가 매춘부들을 찾아가면서도 성관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 보다 직접적으로 포주에게 남성 창부들을 권유받는 점 등이 이 해석을 위한 근거이다.
<브루탈리스트>를 퀴어 영화로 전제할 때 텍스트는 보다 풍부한 맥락을 갖기 시작한다. ‘라즐로’가 찾아가는 매춘부들이 모두 동유럽계 이민자들이라는 점은 소수자 사이의 위계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되며, 동일한 맥락에서 ‘밴 뷰런’의 강간 역시 소수자 내의 억압과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강간을 당한 ‘라즐로’가 대리석이 캐내진 인조동굴을 바라보며 영혼의 상처를 되새긴 장면은 ‘라즐로’의 건축물 속 벽의 틈 사이로 보이는 빛의 십자가와 조응한다. 이렇게 ‘라즐로’의 건축물은 소수자로서 겪은 상처의 예술적 승화로 재해석된다.

영화를 보며 우리는 ‘라즐로’에 대해, 그리고 그의 건축물에 대한 숱한 해석들을 마주하게 된다. 필라델피아의 시민사회는 그의 건축물에서 반기독교적-유대적 상징을 읽으며, ‘조피아’는 그의 건축물은 유대인으로서의 상처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라즐로’의 아내 ‘에르제벳’은 ‘라즐로’는 자신을 위한 재단을 짓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라즐로’는 이 모든 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대신 침묵을 유지한다. ‘라즐로’가 직접 밝힌 건축 의도는 혐오와 감정의 격동,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흐름을 견딜 수 있는 영속적 구조물을 만들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산과 바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재하듯, ‘라즐로’의 건축물은 그 모든 말들 앞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그저 존재하고 있다.

정육면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쉽다. 우리는 ‘라즐로’에 대해 수많은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3시간 반으로 압축된 ‘라즐로’의 생애뿐이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빈약한 오역이다.” (페르시아 철학자, 루미) 혼수상태에 깨어난 후 ‘에르제벳’은 신이 자신에게 이름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신을 언어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신을 ‘야훼(존재하게 한다)’라는 이명으로 부르는 것과 달리 ‘에르제벳’은 신을 자신의 언어로 포획하기를 원한다. 반면 ‘라즐로’는 신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건축물을 통해 그 자신의 신을 보여주기를 선택한다. 영화를 보며 ‘라즐로’에 대해 말을 덧붙이기보다는 그저 관조하기를, 3시간 반의 러닝타임을 있는 그대로 견디기를 권유한다.
- 다음글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모두가 이미 가 있는 그 곳, <몽유도원>(2025)
- 이전글 <두 사람> : ‘우리’라는 서사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