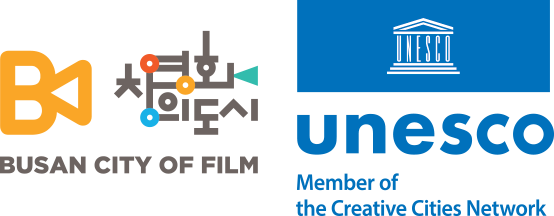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 반출생주의에 대한 소고2024-12-24
-

반출생주의에 대한 소고
이시현 2023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 수상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베네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됐다는 발칙한 주장을 펼친다. 누군가가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고통이 사라진다면 이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존재의 부재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 논변의 핵심이다. 물론 고통과 행복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베네타의 논변은 그리 직관적이지 않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하는 온갖 비유와 논변을 읽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글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의 요약문이 아닌 만큼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내가 굳이 베네타를 언급한 이유는 고통과 행복, 즉 손익의 측면에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일 뿐이니 말이다.

<대가족>의 주인공, ‘함무옥’은 외동 아들인 ‘함문석’이 출가한 이후, 대가 끊긴다는 생각에 제사날마다 우울해한다. 그러나 ‘함문석’의 입장에서 아내가 죽은 다음날에도 장사를 하는 한편,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대신 시신을 기증해버리는 ‘함무옥’이 이토록 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함무옥’은 극중 돈을 제외하면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변인들도 그를 “노랭이”라 비난한다. 그는 몇 백억짜리 빌딩 여러 개를 소유함에도 손님들에게 가게 화장실의 휴지조차 아끼기를 종용하며, 매사를 만두국 하나의 이윤인 4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제사에 지독할 정도로 집착하며, ‘함문석’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손자들이 집을 찾아오자 이들에게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 이중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왜 ‘함무옥’은 금전 측면에서 손해밖에 될 일이 없는 혈육들을 그토록 갈망하는가? 이어서, 왜 ‘함무옥’은 본인이 그다지 쓰지도 않는 돈을 축적하는 데 집착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러저러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죽음을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인간의 공포, 후자의 경우 돈이 부재하는 상황에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능하다. 이 두 답변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합리적이며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여의고 아내의 투병 중 돈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함무옥’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극중 개연성 역시 충족한다. 그러나 질문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 두 합리화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맹목적 본능은 애초에 합리성 따위로 설명될 수 없는, 가희 종교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베네타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기피하는 것이 옳다는 지극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반출생주의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공리주의 자체는 정당화의 대상이 아니다. 즉 공리에 대한 베네타의 집착은 종교적 성격을 띤다. 만약 베네타가 아이를 낳는 이들을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한다면, 반대 진영 역시 그를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절대적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선택을 할 뿐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뿐이다.

극의 후반부에서 ‘함무옥’은 친손자라 생각했던 아이들이 사실 자신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자 그는 혈통을 통해서만 대를 이을 수 있으며 돈을 아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다. 그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과 관계없는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수백억 원을 기부한다. 이렇게 ‘함무옥’은 자신이 여태까지 고수해오던 원칙들이 무의미함을, 즉 공(空)함을 깨닫는다. 자신이 그 원칙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즉 원칙이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면 공한 원칙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함무옥’에게서 부처의 마음가짐을 배웠다는 ‘함문석’의 말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베네타는 그의 책,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를 그의 부모님에게 헌정한다. “비록 그들이 나를 존재케 하였지만”이라는 단서를 남기면서도 말이다. 나 역시 <대가족>을 보며 든 이러저러한 아쉬움에도 여전히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영화에 들이대는 삐딱하고도 엄격한 비평적 잣대 역시 결국은 공한 것 아니겠는가.
- 다음글 당위와 욕구 사이에서
- 이전글 작은영화영화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