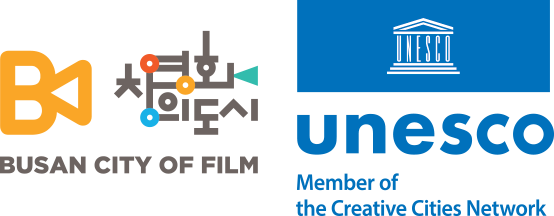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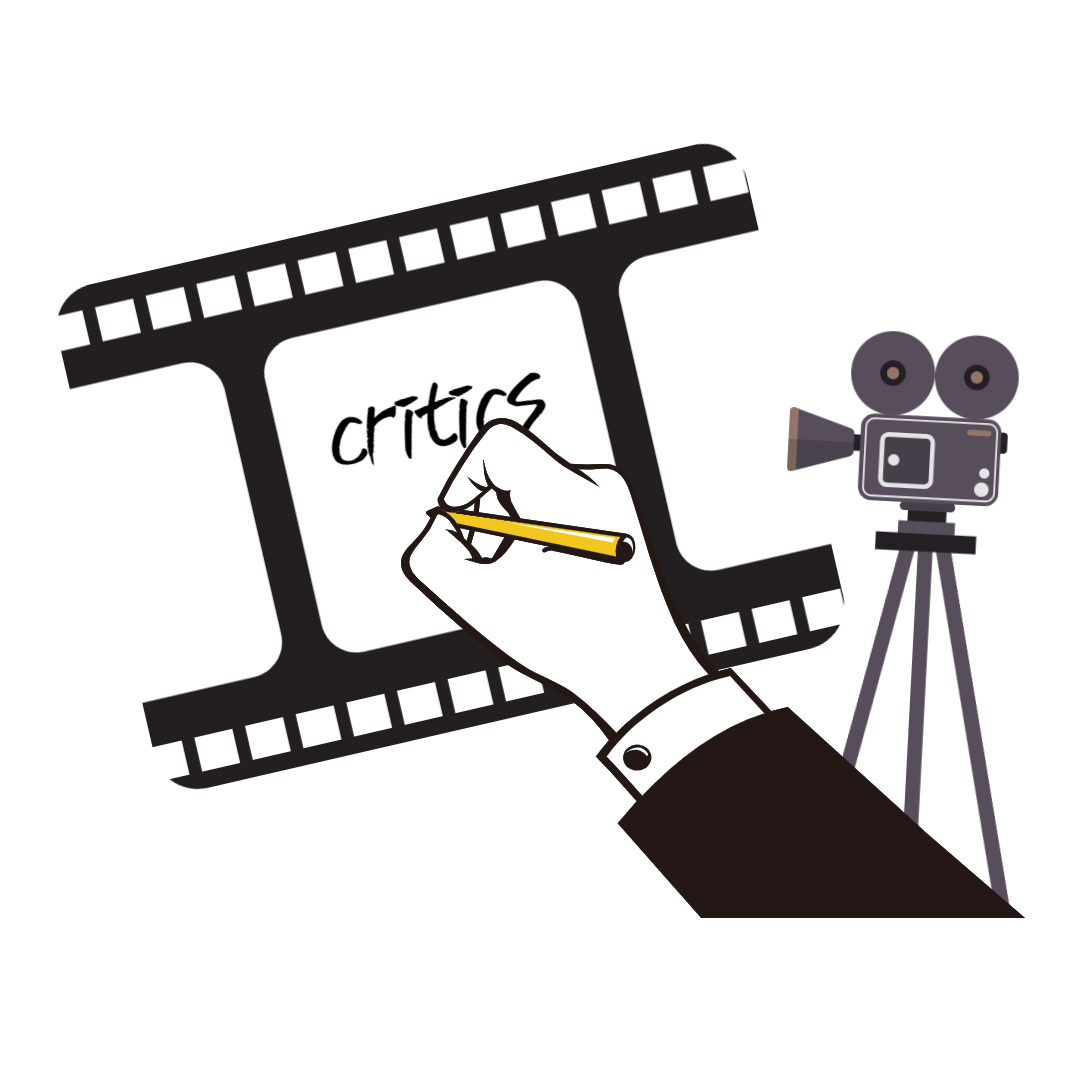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024-11-29
-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시현 2023 영화의전당 영화평론대상 수상자
<아가미>는 70분의 러닝타임 내내 특별한 서사나 사건 없이 진행되는 영화이다. 조명을 배제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화면과, 감독의 표현을 빌려 음악보다는 음향에 가까운 bgm은 관객에게 불편함을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아가미>가 이런 불친절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아마 감독이자 주연배우, 유승원이 세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유승원은 자신의 본명인 ‘승원’으로 출연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다. ‘승원’은 고통의 원인을 무명 연극배우로서의 경제난, 복잡한 가족관계, 자신의 방조차 마련되지 않은 고향집 등에서 찾아보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창고를 뒤적이는 ‘승원’의 모습은 고통의 원인을 탐색하는 작업 역시 무의미할 것임을 암시한다.

<아가미>의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재혼 가정에 적응하지 못해 성인이 되자마자 배우의 꿈을 이유로 집을 나와 작은 극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승원’은 7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갑작스레 듣게 된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혹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지, ‘승원’은 충동적으로 극단을 그만둔다. 그 길로 어릴 적 살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간 ‘승원’은 티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며칠을 흘려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복 남매인 ‘가현’이 갑작스레 집으로 오게 된다. ‘승원’이 집에 와 있는 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이것저것 먹을 것까지 챙겨온 ‘가현’은 자신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곧 노량진으로 떠날 것이라 말한다. ‘가현’이 찾아온 이후로 무기력하게만 하루하루를 보내던 ‘승원’의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마치 이 집에 자신과 ‘가현’ 외 다른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승원’은 주위의 모든 것이 불안하게만 느껴진다.

물론 고향집에 숨겨진 비밀 따위는 없다.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냄새를 풍기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건대 거대한 맥거핀들에 속은 것만 같아 허탈했으며 감독을 조금은 비난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부 괜찮을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걸작이라 칭송받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 속 청춘들 역시 자신들의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날 청춘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계급이나 인정욕구 등으로 환원시켜 버리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사회학자들조차 분석에 실패하는 문제의 해답을 한 명의 예술가에게서 찾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적어도 자신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진솔하게 말하는 유승원 감독의 용기가 오히려 보기 좋았다.

영화의 결말부에서 ‘승원’은 고향을 떠나 다시 극단 생활을 시작하며, 노량진으로 떠난 ‘가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물론 ‘승원’의 극단 선배 역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가현’의 새로운 일상 역시 즐겁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숨막히는 공기에서 시작했던 영화가 등장인물에게 숨쉴 공기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나는 <아가미>의 다소 무책임한 긍정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승원’과 ‘가현’, 그리고 이 시대의 청춘은 자신이 무엇을 찾아 다니는지, 그리고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지 끝내 이해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동일한 장소에 머무르며 고민의 크기를 키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통, 불안, 성장 그 모두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헛된 고민은 그저 우리를 괴롭힐 뿐이다.
- 다음글 <아침바다 갈매기는>(2024, 박이웅), 농담처럼 사소화된 편견과 차별
- 이전글 쉽게 볼 수 없기에 아쉽고도 소중한, <최소한의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