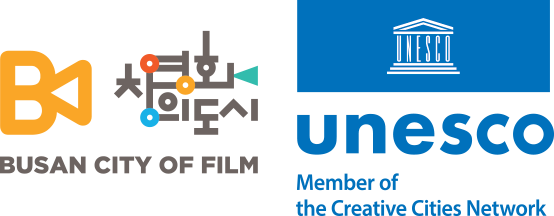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부모 바보>: 한국 독립영화에서 대안적 서사는 가능한가2025-01-20
-

<부모 바보>: 한국 독립영화에서 대안적 서사는 가능한가
김현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이종수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 <부모 바보>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의미로 당혹스러울 수가 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건 관객의 잘못이 아니다. 이종수 감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 당혹감을 제쳐두고 이 영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굳이 한 줄로 말하라면 사회복지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의 일상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대리 직급의 진현(윤혁진 배우)은 두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영진(안은수 배우)은 지각이 잦고 근무시간마다 졸고 있다.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며 어두운 안색에 푹 숙인 고개,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 캠코더를 손에 들고서 뭘 찍는지 알 수 없는 그의 행동이 여러 모로 불안해 보인다. 영진은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복지관 앞 다리 아래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진현은 영진을 자신의 집에서 당분간 묵도록 해준다. 복지관을 찾아오는 노인 중 한 분인 순례(나호숙 배우)는 이상한 할머니다. 진현을 찾아와서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아들을 그렇게나 자랑하면서도, 경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필품 같은 것들을 달라고 계속 생떼를 부린다. 진현을 수시로 압박하는 잔소리하는 상사들, 복지관장과 과장 또한 진현의 스트레스다.

이종수 감독은 자신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부모 바보>의 시나리오를 썼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영화들,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가는 극영화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이야기에 종속되길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편의 완결된 서사를 가진 극영화의 길을 택하지 않고 에피소드들의 느슨한 연결을 택하는 것이다. 영화 속 에피소드들은 현실의 단면들을 다큐멘터리처럼 관찰하는 느낌을 준다. 인물들의 사연도 간략하게나마 제시되지만, 그걸 더 깊이 파고들어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영화 속에 없다.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기승전까지는 가는데 결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앞서 말한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영화는 결말의 서사 대신에 영진이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들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줌인으로 촬영한 다리 아래의 풍경들, 나뭇잎들, 여러 사물들의 클로즈업된 이미지들이 (이종수 감독이 직접 만든) 기묘한 느낌의 전자음악과 함께 제시된다. 영화를 보던 관객들에게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던지는 이런 방식. 결말에 앞서서 ‘부모 바보’라는 작은 손글씨들이 낙서처럼 화면에 열 개도 넘게 뜨는 타이틀 자막이나, 역시 손글씨로 영화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인 ‘백진현’, ‘임영진’, ‘박순례’가 거대한 크기로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영화가 뭔가 엉뚱하고 삐딱한 길로 나아갈 것이란 예고처럼 느껴졌다.
이종수 감독은 왜 이런 형식을 택한 것일까. 정확한 답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진현이 자신이 한때 영화광이었고, 독립영화들도 많이 챙겨봤었다는 이야기를 영진에게 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애. 취직 안 되는 백수 얘기, 아니면은 방황하는 청춘들 어디 강가에 모여가지고 분위기 잡고, 똥폼이나 잡고 있고...” 한국 독립영화의 닳고 닳은 진부한 패턴을 비웃는 이 대목은 마치 이종수 감독의 도발이자 출사표처럼 들렸다. 자신의 영화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 이종수 감독은 인물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과 이미지와 음악이 주가 되는 비디오 아트의 형식으로 이야기 위주의 극영화의 형식을 조금이나마 비껴가려 한다. 그의 다음 영화 <인서트>에서도 이런 실험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이종수 감독은 과연 한국 독립영화의 얼터너티브가 될 수 있을까.
- 다음글 <로컬 픽, 시간과 빛: 10%의 사건과 90%의 반응> : 초심자들
- 이전글 <힘을 낼 시간> : 케이팝의 사상자들,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