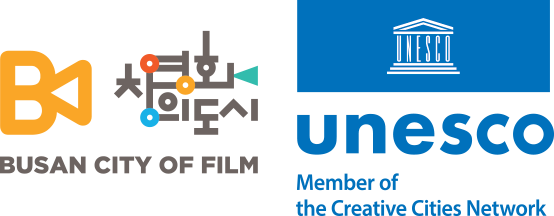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 희미함을 끈질기게 붙드는 이들에게 찬사를 -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2025-03-31
-

희미함을 끈질기게 붙드는 이들에게 찬사를
-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
송아름(영화평론가)
‘그냥 좋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냥’ 좋은 것은 어떠한 이유도 필요치 않기에 싫어할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탓이다. 누가 무어라 하든, 어떤 상황을 겪든, 그냥 좋은 것 앞에선 모든 것이 수용되고 모든 것이 허락된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가까이 닿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냥’의 힘은 그렇게 누군가의 동력이 되고 종종 어떤 것에는 희망이 된다.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이하 <여성국극>)의 국극 배우들이 ‘여성국극’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1950년대의 전성기를 거쳐온 1세대의 조영숙과 2세대의 이옥천과 김성예, 3세대의 박수빈과 황지영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것이 그때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용어인지 따지며, 어두운 무대를 더듬어가며 자리를 찾아 서는 것은 국극을 위해 스스로가 만들어 낸 고충일테다. 그러나 이를 걷어낼 수도 걷어낼 생각도 없다. 그것은 곧 그들이 ‘그냥 좋아’ 선택했던 국극 배우로서의 빛나는 흔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극을 통해 배우들은 자신의 소리를, 모습을, 삶을 찬찬히 찾아나간다. 박수빈은 자신의 소리에 해가 쨍쨍하다는 누군가의 평이 어떤 의미일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을 이야기한다. ‘아, 나의 소리엔 그늘이 없구나.’ 이 생각에 이르게 했을 국극 배우의 시간, 그리고 ‘그늘’을 담아내려는 이후의 고뇌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감히 짐작하기 힘들다. 또한 배우들이 나에게 어떤 역할이 적절할 지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나를 알고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장 돋보이는 니마이를 원한다 해도 이를 할 수 있는 이와 하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어렵게 이 과정을 거쳐 여성국극을 무대에 올려도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가치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분명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마치 관문을 거치듯 점점 어려워지는 국극의 존재 증명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배우들은 이 모든 난관이 순서없이 뒤엉키는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그냥 좋아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꽉꽉 붙들어 맨다. 93세인 국극 1세대의 배우와 93년생 국극 배우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이다. 니마이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선 삼마이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도,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지라도 일단은 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지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이 국극 속에서 발견한 이치이다. ‘한국 최초의 뮤지컬’ 여성국극을 위해 불러주는 곳이 어디든, 객석이 얼마나 마련되었고 그곳을 채우는 이들이 얼마가 되었든 일단 달려가 무대에 서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삶이자 현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세대를 넘어 현재에 이르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후배 국극 배우들이 마주한 현실은 꽤나 팍팍해 보인다.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국극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듯 보이지는 않는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거대하지만 보여달라는 것은 사소하고, 보여줘야 할 것은 넘쳐나지만 보려는 이들은 한 줌인 듯 빠져나간다. 황지영과 박수빈이 일본의 다카라즈카 공연을 보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던 것, 그 공연에서의 환호와 거대한 객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모습 등은 현재의 국극과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힘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그럼에도 국극에 대한 열렬한 짝사랑은 관객이 있어야 하고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응집시킨다. 재고 자르고 셈할 필요 없이 마냥 좋은 국극의 힘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움직였다.

3세대 국극 배우들은 다카라즈카가 유지될 수 있던 힘이 국극에 역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활짝 열어 두었다. 1, 2세대의 국극 배우와 3세대의 국극 배우가 한 무대에 서는 것, 그 벅찬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국극을 지키려는 이들에 대한 선배의 안쓰러움과 고마움, 그것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후배의 이해와 용기, 이로써 완성되는 연대는 연습 장면의 사소한 행동과 목소리들에서, 모두가 무대를 완성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속 절절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제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모두의 목표가 된 여성국극의 무대는 많은 이들의 박수와 호응 속에서, 안정된 무대 위에서, 너무도 찬란하게 자리할 수 있었다.
<왕자가 된 소녀들>(2012)이 과거 여성국극으로 한 시절을 보냈던 배우들의 현재에 집중했다면 <여성국극>은 국극이 현재에 자리할 수 있는 이유를 조망한다. 과거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과거도 아닌 여성국극은 어떤 작품이 화제가 되어 주목받는 것이라 넘겨짚을 필요도 없이 늘 어딘가에 꿋꿋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국극을 사랑하고 또 공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결코 놓지 않은 이들이 희미하지만 탄탄하게 이어온 역사를 인정하고 또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뮤지컬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의 기저에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여성국극이 하고 싶었다는 소박한, 어찌보면 무모한 꿈이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또 이어갈 이 무모함에 대한 응원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몫일 것이다.

- 다음글 왜곡된 존재 증명의 섬뜩한 결과 - 영화 <침범>이 날 세워 그린 순간들
- 이전글 <컴플리트 언노운>, 살아있는 전설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