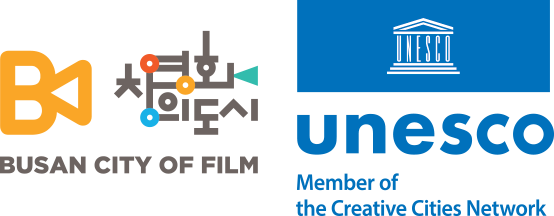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 '나루세 미키오 특별전'특별강연: 임재철 영화평론가 2016-02-04(목) - 시네마테크
-

2/4(목) <만국>
*강연: 임재철 영화평론가
*장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체 강연중 일부만 요약되어있습니다.)
‘나루세 미키오’란 사람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자기주장이 없는 사람이며, 그의 특징 또한 자기주장이 없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표면적인 주제와 같은 걸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경력, 영화 모든 면에 있어서 편하게 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측면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영화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특히 감독이라고 했을 경우에 단순히 영화의 한 스텝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감독 중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하게 자기주장이 강하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고집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금방 되는 일도 아니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영화도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규모가 작은 영화라고 해도 스텝에 배우까지 합치면 40명은 될 텐데 그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사람이 확실한 자기 입장이나 주장이 있어야 하다 보니, 영화 쪽에 과도하게 자기 포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도있습니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화 업계도 마찬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세 미키오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측면이 너무 없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경력이나 이 사람의 행적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영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장이 없다는 게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뒤집으면 개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영화감독이 될 수가 있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89편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의문도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특히 할리우드 영화와 일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할리우드와 일본 영화의 50년대까지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죠. 스튜디오 안에서는 사실은 직원입니다. 말하자면 감독이란 것도 결국엔 스튜디오 안에서는 한 사람의 직원이에요. 직원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장점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구나, 그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잘 하는데 루틴 한 일을 못한다거나 창의성은 전혀 없는데 주어진 일은 굉장히 잘하는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라는 건 일종의 회사라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영화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나루세 미키오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튜디오에서 끝까지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1969년에 나루세 미키오가 죽었으니까, 사실 나루세 미키오가 죽을 때가 일본의 스튜디오의 촬영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던 그 시기예요. 더 이상 영화를 자체 제작을 안 하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영화사에 들어가서 소도구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하다가 1930년에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1960년대 후반까지 영화를 했고 그 사이에 회사를 딱 한 번 바꿨습니다. 원래는 쇼치쿠에 있다가 1934년에 나중에 도호라는 회사가 되는 그 당시 PCL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 나루세 미키오의 회고전 같은 경우엔 상영편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전에 국내에서 상영을 안 했던 영화들을 꽤 많이 집어넣으면서 30년대 영화나 40년대 영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나루세 미키오의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거의 50년대 영화들 위주로 봤어요. 그런데 50년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자기주장이 없다는 측면이 있지만 별도로 어떤 측면이 부가가 되냐면 도호라는 스튜디오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감독으로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미 꽤 유명한 감독으로 오즈나 미조구치 겐지 같은 감독들이 5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들 편수만 비교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나루세 미키오가 50년대에 만든 영화가 23편입니다. 23편이나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계속 이 사람에게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화 업계 내에서 안정성이 있었고, 더구나 특히 50년대 초반 영화들은 흥행도 꽤 됐던 것 같습니다.
1951년에 나온 <밥>, 1952년에 나온 <부운> 등 특히, <부운> 같은 영화는 저도 실제로 영화를 보기도 전에 약간 신화적인 얘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 베스트 100』이라고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조사하여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화들에 대한 짤막한 회고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1952년에 처음 <부운>이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그걸 보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45분인가 50분간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런 회고담 같은 걸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본 거죠. 아마 전쟁을 겪고 패전 국가로서 느끼는 것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좀 복합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야기는 한 남녀의 만남이 좌절되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회적인 것까지 투사를 해서 일본 관객들이 보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부운>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뽑은 영화 베스트를 보면 굉장히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5위권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나루세 미키오 감독의 작품에는 컷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길게 찍은 부분과 길게 찍으면서 카메라의 무브먼트까지 만들어 낼 때도 있는데, 배우의 동선에 카메라의 무브먼트까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컷이 길면 그럴듯해 보이고 컷이 짧으면 약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루세 미키오란 감독은 굉장히 잘게 잘라서 그걸 이어 붙이는데 그게 잘게 잘려 있다는 의식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특히 그리고 그 부분은 나루세 미키오의 영화 중 <눈사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눈사태>에서 조감독을 했던 사람이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만, 나루세 감독에게 정말 많이 배웠는데 가장 놀라운 건 되게 컷이 짧은데 나중에 붙여 놓고 보면 그 여러 개가 거의 한 컷처럼 느껴진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인적인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잘게 잘라서 이어 붙이는데 그것이 관객들에게 잘게 잘려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쉬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f !supportEmptyPa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