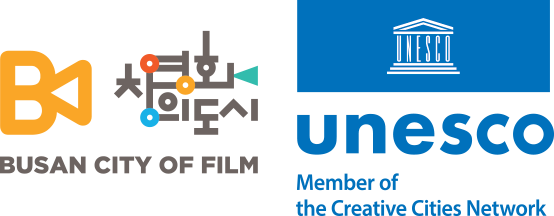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불안은 연애를 잠식한다2023-02-14
-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불안은 연애를 잠식한다
김현진 (시민평론단)
지난번에 평을 썼던 영화 <희망의 요소>와 이 글에서 언급하려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이 두 영화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번듯한 직업이 없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점이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계급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불안과 불화의 문제가 생겨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랑을 그리는 영화들의 스산한 풍경이다.

아영(정은채)은 미술을 전공했지만 생계를 위해 공인중계사 일을 하고 있다. 대학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 준호(이동휘)는 아영의 집에 얹혀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틈틈이 알바를 한다. 준호가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면서 아영은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진다. 둘은 별 거 아닌 일에도 자주 발끈하게 되고, 결국 다투다 헤어진다. 로맨스의 누적이 아닌 스트레스의 누적.
두 사람에게도 각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아영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터를 찾고 있는 IT 중소기업 CEO 경일(강길우)을, 준호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친구의 간섭과 구속에 질린 대학생 안나(정다은)를 만나게 된다. 경일은 준호와 대비되는 인물이며 안나는 아영과 대비되는 인물이다. 경일과 안나 두 사람은 아영과 준호에게 각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인물들이다. 경일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남자다. 젠틀한 말투와 행동. 안정적인 직업. 안나는 준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이다. 그녀는 준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다. “시험 붙기 싫어서 떨어진 거야?” 경제적 안정과 불안정의 상태. 이 차이가 두 커플의 계급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잘 돼서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 로맨스의 순간들도 오래가지 못한다. 아영과 준호는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또 한 번 열심히 싸우고 진짜로 헤어진다. 아영의 태블릿이 준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지우고 님에서 남으로 돌아선다.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어떤 장르의 영화로 분류해야 할지 난감한 영화다. 연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로맨스보다는 이별에 더 방점을 찍고 있기에 로맨스라고 부를 수도 없고, 웃기는 장면들은 있지만 서로 말다툼하는 장면이 더 많아서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픈 장면이 많은 멜로드라마도 아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현실 연애를 그린 드라마라고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연애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물들 사이의 불안감이다. 아영은 준호와 같이 갔던 점집에서의 점쟁이 말처럼, 아영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준호가 취업준비생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밑 빠진 독’으로 남을까봐 불안하다. 준호는 그런 아영과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다. 이 불안감이 불화로 이어지고 연인 사이를 갈라놓으며 사실상 영화 전반을 이끌고 가는 감정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포 세대니 오포 세대니 하는 말은 이제는 익숙해서 딱히 이슈가 되지도 않고, 솔로는 연애를 미루고 커플은 결혼을 미루고 부부는 출산을 미루는 걸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로 첫 장편영화를 만든 형슬우 감독은 오래된 커플의 이별을 통해 연인 사이에서도 스며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물론 현실과 이상을 같이 잡으면서 살아가긴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형슬우 감독은 배우 서현우와 공민정이 출연한 단편영화 <병구>를 통해서 독립영화계의 기대주로 주목받은 신인감독이다. 그는 첫 장편영화에서 그의 단편들에서 볼 수 있었던 위트와 유머를 적절히 담으면서도, 현실 연애의 서늘함과 씁쓸함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본다.
- 다음글 <찬란한 나의 복수>: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 이전글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죽음에 대한 성숙한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