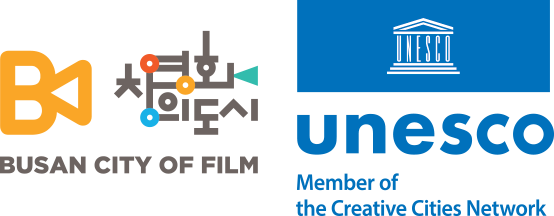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론글은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글을 통해 들여다본 새로운 영화세상으로 떠나보세요!
- 월드시네마 XIV <엔젤>2017-04-07
-

분명함의 작은 틈새에서
구형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엔젤>을 비롯한 루비치의 영화를 보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다. 어쩌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1922년 이후에 제작된 루비치의 영화들은 분명 할리우드 시스템에 놓여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자신의 영화적 속성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그의 영화는 정확한 장소와 시대를 지명하며 서사를 형성하고, 장르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완성된다. 또 어떤 장면들은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 혹은 흔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대놓고 정치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는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코미디 대사들을 불쑥불쑥 쏟아내기도 한다. 그의 영화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영화적 정체성이 있으며, 심지어 가끔은 도식적이다.
하지만 이런 영화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화들을 보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라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영화적 분명함이 영화 안에서 뒤섞이며 작은 틈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루비치의 영화에서 종종 로맨스는 범죄물과 코미디 사이에서 간극을 만들어내고, 서사는 사건의 사이사이에서 틈을 보인다. 하지만 보통의 영화감독이라면 지우거나 무시하기 마련일 그 틈과 간극을, 루비치는 오히려 더 집중하고 주목한다. 그리고 그 틈새들은 영화의 곳곳에 갑작스레 나타나며 영화를 확장하거나 축소시켜 버린다. 이러한 틈새의 확장은 분명했던 영화의 자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종종 영화의 중간을 구멍 내듯 비워버린다. 결국 루비치의 영화들을 보다보면 영화가 불투명하고 쉽게 휘발되어 버리며, 손에 쥘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렇기에 루비치의 영화는 분명함에서 출발하지만 그 틈새를 통해 한없이 모호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작품으로 들어가 보자. 앞서 언급했듯, 그의 영화 속에는 명백하게 두드러지는 영화적 속성이 몇 가지 있다. <엔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리아와 앤서니, 프레드릭 사이의 삼각관계에는 미묘하고 섬세한 멜로드라마가 있으며 또한 그 외피와 중심에는 코미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장르의 기능은 영화의 서사를 이끌고 감정에 중요한 축이 되며,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오가고, 인물을 엮거나 풀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장르적 근간은 직접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며, 특히 봉합하고 축소하는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장르의 속성과 함의만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것은 어딘가 미진한 기분이 든다.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보자. 과연 인물들의 관계를 멜로드라마의 관습과 도상, 서사 규칙들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세 주인공의 삼각관계는 그저 긴장감의 교류일 뿐이며, 절절하고 애절한 로맨스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것일 뿐인가? 요컨대 작품의 세계는 온전히 장르의 틀 속에서만 출발하고 끝맺음하고 있는가? 문제는 <엔젤>이 섬세한 멜로드라마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멜로드라마의 정서로는 포섭되지 않는 기묘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세히 보면 <엔젤>이 로맨스와 코미디를 내재하는 과정은 언뜻 도식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루비치는 의도적으로 인물의 사랑과 서사에 집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외면하려 노력한다. 마리아와 앤서니는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며, 마리아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겪는지, 또한 마리아와 프레드릭의 관계는 어떻게 멀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어떤 외로움을 경유했는지 등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세밀한 서사적 배치는 모두 절제되어 있거나 아예 없다. 그렇다면 관객은 그들의 사랑과 질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루비치는 감정과 서사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대신 오히려 그것들을 배제하며 그 사이사이에 미묘하고 기이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인물이 프레드릭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자. 식사를 하기 전 앤서니와 마리아는 서로를 보고도 놀라거나 긴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대담하게 사랑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집사는 요리를 먹지 않은 마리아와 앤서니의 접시를 보고, 앤서니가 송아지 요리를 싫어할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앤서니와 마리아가 사랑에 빠지는 동안 나눴을 깊은 교감도, 불륜임을 알게 된 후 가졌을 불편하고 긴장되는 마음도 세세하게 보지 못한 관객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그러나 이 장면에는 미묘한 힘이 있다. 이 장면을 대면한 관객은 우선 마리아와 앤서니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목은, 이내 평범한 그들의 대화를 보며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문과 내적 긴장감은 음식을 그대로 남긴 접시를 통해 가시화되며 확장된다. 결국 앤서니와 마리아가 남긴 요리는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둘 사이에 오가는 긴장과 불안의 응축이며, 관객이 가진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고, 어딘가 모르게 야릇한 로맨틱함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오브제인 것이다. 하지만 집사는 남겨진 접시를 보며 송아지요리에 대한 취향의 문제라고 말해버린다. 그 순간 남겨진 음식의 기저에 깔린 감정과 함의는 농담이 되어 사라져 버리고, 단숨에 휘발되어 버린다. 그 결과 그 장면의 대화와 에너지는 로맨스의 긴장감도 아니며 코미디의 발랄함도 아닌, 그 사이 미묘한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결국 마리아와 앤서니 사이의 사랑과 고민, 긴장감과 같은 것들은 증발한 채 조금은 뻔뻔하면서 싱거운 농담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루비치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영화의 틈새는 바로 이런 순간이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경유하며, 루비치의 영화가 어느새 뒤틀어져있고, 의도적으로 중간이 비어져 버리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런 양상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것들을 쌓아가지만 그 결과를 모호하고 미묘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엔젤>의, 나아가 루비치 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성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루비치는 장르, 감정, 농담, 긴장과 같은 영화적 속성들을 통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딪히거나 결합될 때, 혹은 그것들의 간극과 틈새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그리고 그 간극과 틈새는 텅 비어 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다. 관객은 루비치의 영화를 보며 범죄물의 긴장감 속에서 로맨틱한 순간을 만나게 되고, 애절한 로맨스의 와중에 기묘한 유머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루비치 영화의 미덕이자, 힘은 아닐까. 영화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줄 때, 거꾸로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다음글 아일랜드 영화 특별전 <심야의 탈출>
- 이전글 월드시네마 XIV '마야 데렌' 감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