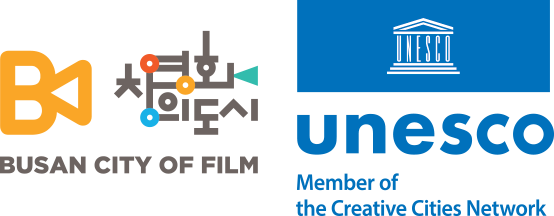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평론글은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글을 통해 들여다본 새로운 영화세상으로 떠나보세요!
-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라 보엠>2019-05-02
-

둘이자 셋이지만 결국 하나인 세계 : <라 보엠> (킹 비더, 1926)
구형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어쩌면 의외로 느껴질만한 점이 하나 있다. 애절하고 아련한 <라 보엠>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외적이고 독창적인 서사라기보다 오히려 지극히 전통적인 서사라는 점이다. 로돌프(존 길버트)와 미미(릴리안 기쉬)의 러브스토리는 사실 할리우드 영화가 견고하게 쌓아온 멜로드라마의 전형성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어쩌면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 이 영화를 만난 관객들은 <라 보엠>의 서사를 뻔하고 상투적인 멜로물 정도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물론 전통적 서사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영화의 흠이 될 수는 없지만, 여하간 여기서 서사적 새로움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영화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감독들이 간과하곤 하는 이 사실을 킹 비더는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영화는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미지, 혹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이다. 서사는 다만 그 이미지와 움직임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같은 것일 따름이다. 그렇기에 범속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싸고 있는 ‘영화’가 스스로 운동한다면 그것만으로 무수히 많은 심연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 보엠>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영화’가 되는 킹 비더적 사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서사를 넘어선 의미에서의 영화를 보고, 그 속에서 어떤 절절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가 프레임 속에서 어떤 미세한 운동들과 결합할 때, 영화는 단순한 움직임만으로 우리를 통속적인 이야기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 강렬하고도 아득한 실재로 이끌기 때문이다.
먼저 킹 비더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해보고 싶다. <라 보엠>에는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공간이 있다. 바로 로돌프와 미미가 사는 집의 복도이다. 이 복도를 비추는 프레임의 맨 앞쪽, 오른편 아래에는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과 난간이 있고, 그 왼쪽 뒤편으로 로돌프와 친구들이 사는 방의 문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면 미미가 사는 방의 문이 있다. 영화는 이 복도를 거의 유사한 앵글로 빈번하게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복도는 거의 매번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먼저 로돌프가 미미에게 첫눈에 반해 미미의 방문 앞에 멍하게 서 있는 장면을 보자. 이때 로돌프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미미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단에서부터 올라와 왼쪽의 방문으로, 다시 왼쪽에 있는 로돌프의 방문에서 나와 오른쪽 계단 앞을 오가며 몇 번의 프레임 인-아웃을 반복한다. 고정된 프레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이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연극의 입장-퇴장으로 구성되는 동선을 연상케 하며 고정된 프레임 속에 (연극적인)운동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운동감 속에는 자연스럽게 미미와 로돌프가 느끼는 수줍은 호감, 친구들이 형성하는 활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감 등이 묻어난다. 말하자면 이 장면에는 공간과 그 공간 속 움직임들, 그리고 인물의 정서와 서사의 진행이 온전히 조화롭게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절묘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 활기찬 복도는 전혀 다른 정서의 공간으로 뒤바뀐다. 폴 자작(로이 다아시)이 흑심을 품고 미미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상기해보자. 폴과 함께 있는 미미를 본 로돌프는 질투가 나서 분통해 하고, 폴이 방문을 나와서 계단 밑으로 내려갈 때 그의 뒤에서 폴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따라 하며 걸어 나온다. 이 장면에서 폴의 프레임 아웃과 맞물려 왼쪽에서 프레임 인 하는 로돌프의 연쇄적 움직임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를 연상케 하며 과장된 몸짓과 인물의 적개심을 효과적으로 병치한다.
인상적인 점은 복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들과 거기서 비롯되는 정서들이 영화 속에서 무수한 방식들로 변화하며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극적 운동과 슬랩스틱적 운동이 함께 있으며, 또한 사랑과 질투와 우정과 계급이 어지럽게 교류하고 있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 귀속시키는 카메라가 있다. 결국 박제된 듯 같은 모습의 복도를 여러 번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맥락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킹 비더는 기본적인 영화 기법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과 영화의 표면을 하나로 만든다. 로돌프가 자신이 쓴 각본을 미미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상기해보자. 벅찬 마음에 1인 2역으로 자신의 각본 속 내용을 재연하는 로돌프를 카메라는 숏-리버스 숏으로 담아낸다. 결국 영화 속 영화처럼 구성된 이 작은 재연이 1인 2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숏-리버스 숏의 구조 속에서 아(我)와 타(他)로 분화된 로돌프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보다 진중하며, 그것을 반영하듯 미미는 그의 재연 속에 깊게 몰입하고 감동한다.
그러나 이후 미미가 폴에게 로돌프의 각본을 재연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미미의 1인 2역을 담는다. 로돌프와 달리 미미의 1인 2역은 그저 풀숏으로 길게 담겨있을 뿐이라, 미미의 어수룩한 연기는 진중하기보다 우스꽝스럽고 또 어딘가 조금 안쓰럽게만 그려진다. 왜 미미의 1인2역은 로돌프와 달리 단순한 풀샷으로만 담기는 것일까.
(낭만적인 수사처럼 읽힐지도 모르겠지만)이유는 바로 사랑의 유무에 달려있다. 로돌프가 미미에게 각본을 재연해줄 때 거기에는 서로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려 있음에 반해, 미미가 폴에게 같은 내용을 재연할 때 거기에는 미미를 속여서 마음을 얻어내려는 폴의 흑심과 그것에 농락당하는 미미의 우스꽝스러운 헛수고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영화는 1인2 역과 숏-리버스 숏의 유무라는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로돌프와 미미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과 폴의 치졸한 수작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숏-리버스 숏이라는 영화의 기법은 단순히 이 숏과 저 숏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넘어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가 매우 내밀하게 반영된, 생동하는 감정의 표상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킹 비더는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들 속에 인물의 감정과 관계, 미세한 공간의 변화를 담아내고, 나아가 서사의 구체적 현존들을 영화의 운동 속에 머물게 만든다. 여기에는 통속적인 이야기의 세밀한 틈새에 스며들어있는 놀라운 영화적 장치들이 있고, 동시에 그 장치들과 매우 깊숙하게 호흡하는 사랑, 이별, 열정, 비애 그리고 죽음이 있다.
이제서야 나는 바스러져 가는 릴리안 기쉬의 클로즈업이 왜 그렇게 강렬하고도 슬픈지 조금 알게 되었다. 서사와 영화와 감정과 인물들이 개별적 요소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맹렬히 운동하면서 공존하고 있기에,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 이 서글픈 사랑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클로즈업은 너무나 강렬하고, 이야기는 너무나 절절하다. 서두에 말했던 영화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내부에 있는 모든 생동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움직임 말이다.
- 다음글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메콩호텔>
- 이전글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마지막 국화 이야기>